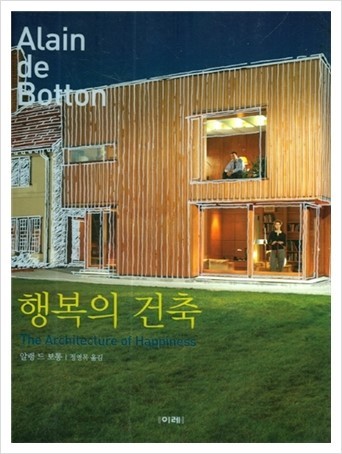행복의 건축/알랭 드 보통/이레/2007
지성이 성장하는 곳에 행복의 건축은 있다
건축에 관련한 에세이집,『행복의 건축』의 저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한다. “건축의 의미를 믿을 때 그 전제는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는 관념이다.”라고. 장소는 단순한 3차원적 공간만은 아니다. 우리가 여행을 꿈꾸는 것도 여행지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을 약속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장소는 사람의 기분을 바꾸고 나아가 심성을 바꾼다.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쇄원(瀟灑園)에 들어서 보라. ‘소쇄(瀟灑)’는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요, 식영정(息影亭)이란 이름은 그림자마저 쉬게 하는 집이라는 의미다. 그 장소는 우리에게 무욕의 삶, 유유자적의 삶을 권한다.
풍수학에는 ‘지령인걸(地靈人傑)’이란 말이 있다. ‘땅은 영묘(靈妙)하고 사람은 빼어나다’는 뜻이다. 산천이 수려하고 지세가 빼어나서, 그 땅의 기운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도 한결 뛰어나다는 의미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노동의 에너지를 빌어 공간을 창조해내지만, 공간 역시 공간이 지니는 에너지로 인간을 만들어 낸다. 땅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에너지가 곧 지령(地靈)이다. 풍수학은 이 에너지를 보유한 공간, 이른바 ‘명당(明堂)을 찾기 위한 인간의 총체적인 노력이었다. 좋은 목수는 좋은 집터를 잡아 좋은 집을 짓기를 꿈꾼다. 과연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 <어린왕자>의 작가 쌩떽쥐베리는 소설의 인물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문에 제라니움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 고 말하면, 그 분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내질 못한다. “십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 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거 참 굉장하구나!”하고 감탄한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날 집은 수량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 이름도 거창하게 ‘OO캐슬’이다. 집이 아니라 차라리 castle, 즉 성(城)이다. 군사적 개념으로서의 성(城)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긴장과 대결의 공간이다. 과연 이런 이름을 가진 곳에 안락함이 깃들 수 있을까. 그러나 건축주는 복잡하게 따지지 않는다. 고객들이 건물을 구입함으로써 성주(城主)로서의 위엄을 만끽하면 그만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완당(阮堂)으로, 정약용 선생이 여유당(與猶堂)으로 호를 정한 것은 집을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당(堂)’은 곧 ‘집’이라는 뜻이다.) 집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집으로부터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몰아냈다. 그리고 거대한 규모를 사양했다. 보들레르도 말하지 않았던가. “궁전에는 친밀의 공간이 없다”라고. 한 도시락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이면 족하다는 안분지족의 삶을 담아내면 그만이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집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삶이었다.
알랭 드 보통이 그의 책 이름을 ‘행복의 건축’이라고 붙인 것은 건축물은 행복[삶]을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있는 장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승려라는 정체성은 고독한 산사(山寺)라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고, 학자의 정체성은 연구실이라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던가. 공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라. 거기에서 과연 어떻게 주거자의 정체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
스위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꾸밈과 장식을 거부하고, 절제를 미덕으로 아는 ‘수도사의 방’을 건축적 이상으로 생각했다. 이는 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기존 건축가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다. 알랭 드 보통은 르 코르뷔지에와는 달리 건축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며, 우리는 집이 우리를 보호해주길 바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건축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준다. 고전주의 건축물들은 독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표준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은 장식을 혐오하고 검약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모더니스트의 건축들은 건물이 순수하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며, 히틀러 시대에 지어진 독일의 건물들은 높이와 부피, 그림자 등 시각적 비유들을 이용해 전체주의 시대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의 대리석으로 치장된 건물들은 졸부의 욕망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말해준다.
물론 건축물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모든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소설이나 시, 한편의 유행가도 나름대로의 사연과 곡절을 우리에게 전한다. 문제는 소설이나 시, 유행가가 전하는 이야기가 마뜩찮을 경우, 책장을 덮어버리든지, 오디오 기기의 전원을 끄면 그만이지만 건축물이 전하는 이야기가 마뜩찮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눈을 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혐오스런 건물이 주는 시각적 폭력이다. 알랭 드 보통은 이를 간명하게 표현했다. “나쁜 건축은 커다랗게 써놓은, 지우기도 어려운 잘못이다.”라고. 덧붙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더 나은 쪽으로 환경을 조정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믿음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다.” 더 아름다운 건축을 지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대체 건축물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사실 아름다움에는 만인의 합의로부터 도출된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아름다움을 보는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건축의 역사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시대와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세계 건축의 다양함은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의 지역적 편차를 확인시켜준다. 알랭 드 보통이 드는 예가 재밌다. 1900년 일본의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는 영국으로 여행을 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에 영국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 나는 스코틀랜드에 초대를 받아 궁궐 같은 집에 머물게 되었다. 어느 날 주인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다가 줄지어선 나무들 사이의 작은 길에 이끼가 두텁게 덮인 것을 보았다. 나는 칭찬을 하면서, 그 길들이 멋지게 나이를 먹은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곧 정원사에게 이끼를 모두 긁어내게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인간의 인위를 배격하고 자연을 그대로 둘 것을 말하고 있는 ‘무위자연’의 동양의 세계관과 야생적 자연은 그 자체로 미가 될 수 없는 혼돈에 불과하다는 서양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스탕달이 말하듯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만큼이나 아름다움의 스타일도 다양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의 졸부의 건물이든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든 모든 건물은 다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아무리 추한 건물이라도 나름대로의 미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미학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알랭 드 보통은 우리들의 미의식, 미를 분별해내는 취향은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단맛에 길든 어린아이의 키가 크고 지혜가 성장하면서 입맛이 달라지듯 아름다움에 대한 취향도 인간의 지적 성장과 함께 얼마든지 발전해간다. 한 사람의 미적 취향이 속물스런 예술, 소위 ‘키치’에 못 박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색하고 더 많이 성찰할수록 우리가 사는 곳은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우리의 지성이 성장하는 곳, 우리의 미학적 취향과 감수성이 고양되는 곳에 ‘행복의 건축’이 있다. 전체 가구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60퍼센트에 육박하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알랭 드 보통이 말하는 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가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아름다움의 가능성은 우리의 지성이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